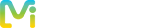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병행수입은 해당 상품의 해외 권리자와 국내 권리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한 경우, 국내 권리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상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②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장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③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각 품질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즉, 병행수입제품이 상기 1, 2, 3번을 만족할 경우 경우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병행수입 사업자를 대리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제기한 병행수입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채무자로 호주의 화장품 업체의 제품을 병행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채권자 B씨는 호주 화장품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사업자입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병행수입 행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며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밝혀 채무자 A씨의 병행수입 행위가 적법하며,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판매금지가처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B씨가 해당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는 B씨가 아니라 C씨였기 때문입니다. C씨는 과거 병행수입을 하던 A씨를 상표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으나,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씨의 병행수입을 저지하지 못한 C씨가 이번 소송을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현재 상표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전용사용권을 등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① 전용사용권 양도계약이 이뤄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으며, ② 현재 상표권자인 업체가 이 사건 등록 상표를 양수하면서 전 상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정이 없고, ③ 이 사건 상품은 제조, 판매하지 않고 여전히 수입하고 있다는 점 ④ C씨가 여전히 이 사건 등록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씨가 B씨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행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의 병행수입 행위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판매금지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