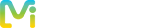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를 변제할 재산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채무자,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가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들을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들는 소외 A에게 부동산 등을 임대해 준 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A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자입니다. A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들은 A가 자신들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한 것이라 추정하고 당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A와 피고 간 허위채권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부동산 매매를 위해 A에게 매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입증했고, 매매계약이 이뤄진 당시의 사실관계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