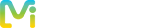법무법인 민후는 건축 시공업체의 공사계약 불이행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건축주이고 피고는 원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 시공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전원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계약금과 설계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전원주택이 지어질 토지 주인과도 토지공급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한편 토지 주인은 피고와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사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본 법인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 토지의 지목(地木)은 임야였고, 건축이 시작되려면 지목을 원고가 변경했어야한다는 논리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와 토지 주인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통 개발행위 허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받고 건축 인허가는 건축주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고, 건축을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토지입니다.
즉, 지목변경의 책임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동업자인 토지 주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토지 주인과 피고는 동업관계이므로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측의 귀책으로 이행이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다시 한번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