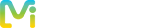최근 약 43억 건이 넘는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고로 인해 낙후된
의료법과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 의료법 제19조와
약사법 제87조에는 의료인이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게 해서는 안되며 환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의료계는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병원 내 행정처리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날로그를 고집해왔습니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인해 의료 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아날로그 시스템이 이를 받쳐주지 못해 개인정보를 두고
불법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3억 건의 의료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낡은 의료계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혐의업체가 의료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판매한 것은 분명 죄질이 나쁘고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정확한 규범이 없다 보니 관련 업체들이
정보를 빼내 음성적으로 거래하고, 국내 제약사나 의료연구 기관은 이를 구입해 연구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의료정보 그레이 마켓’이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현재 의료정보에 대한 관리는 의료법 및 검역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제가 일부 존재하는 수준”이라며 “디지털화 된 의료정보
공유 수요와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 의료정보보호 관련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내 통신사에서 개발한 최신식 의료정보시스템도 낡은 의료법 때문에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제기 되고 있는 의료법의 실태와 이에 대한 김경환 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PREV 잇단 산업기술 해외유출…대책은?
-
NEXT [칼럼]Law&Smart 98_SW 의무교육